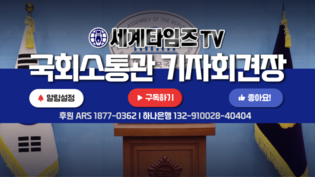|
| ▲ |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13주 연속 상승하며 3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 기간 0.15% 오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1년 이후 약 31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성동구가 0.3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초구 0.31%, 용산구(0.24%), 광진구 0.23%, 송파구 0.23%, 마포구 0.23%, 은평구 0.22% 순위다. 지난달 서울 주택 전셋값은 0.26%, 수도권은 0.28% 올랐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전국은 0.19% 올랐고, 서울(0.42%)과 수도권(0.43%)은 더 크게 뛰었다. 그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년 전보다 4% 이상 올랐다. 빌라 등의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중소형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전세 매물도 줄며 가격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8,238건으로 1년 전보다 19.1% 감소했다. 게다가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강화한 전세 계약 만기가 오는 7월부터 도래하면서 전셋값은 더 뛸 수 있다. 한번 계약하면 4년간 묶일 수 있는 만큼 전세금을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셋값 상승은 집값 상승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갭투자’도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 설상가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감세 정책 예고로 인해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며 집값은 더 오를 수 있다. 문제는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공급이 부족한 데 있다. 현 정부는 주택 270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 부문 공급이 위축된 탓이다. 지난 6월 1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87만 8,000호의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라며 “이런 주택 공급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2025~2026년 집값 폭등이 다시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이 결코 과장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다. 또한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가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 물량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KRIHS)이 지난 4월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 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였고, 착공은 20만 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였으며, 준공은 31만 6,000가구로 73.9%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 6,000가구로 연평균의 37.5%였고, 착공은 2만 1,000가구로 32.7%였으며, 준공은 2만 7,000가구로 연평균의 42.1%에 그쳐 인허가, 준공, 착공 물량 모두 연평균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 30∼40%대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착공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 이러한 부진은 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봐도 서울의 공급 부진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기준)은 38만 9,000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인 47만 가구의 82.7%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 인허가는 목표치 8만 가구의 32%에 그쳤다.
주택 공급은 벽돌 찍어내듯 하룻밤에 뚝딱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라도 정부는 주택 공급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특단 대책을 강구히고 부동산시장 불안을 선제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다. 경제[는 심리지만 정책은 타이밍임을 각별 유념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불붙은 주택 가격과 심리를 잡기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교훈을 과거 사례들에서 충분히 학습했다. 주택 공급 계획과 함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제반 규제를 과감히 풀고, 전세사기 등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정책적 대응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간이다. 또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아파트 공급이 내년부터 앞으로 2, 3년간 이전 3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집 구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만 점점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우리 경제가 폭망하지 않도록 유연한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