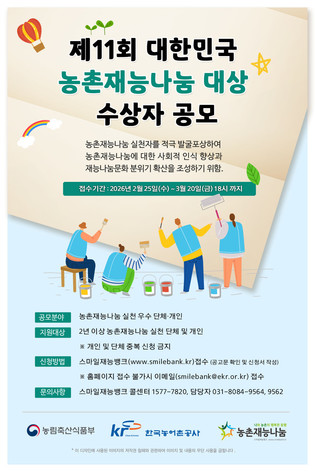|
| ▲ |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자신의 병법을 萬理一空으로 표현한 것은 어쩌면 제법개공(諸法皆空)의 의미와 상통하는 것이다. 제법개공이란 여러 가지 법이 모두 공이란 말이다. 법은 인도어로 ‘dharma’라 하는데, 사회제도, 관습, 도덕, 법률, 종교, 의무, 정의 등 광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법들은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변질되고 소멸되는 것도 있지만, 초시간적으로 영원한 것도 있다.
개개의 사물은 존재자로서 소멸하여 공이 된다. 하지만 그 사물의 自相은 결코 소멸하지 않고 변하지 않아 항상 타당하며 항상 존재한다(俱舍論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靑의 自性(사물의 성격)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된 것이 때문에 물질로서의 靑을 가리키며, 결국은 소멸될 운명을 갖지만, 靑의 自相(본질의 성격)은 환각이나 꿈에서도 볼 수 있는 청색으로서의 청이므로 색깔로서의 청은 청색일반 이란 관념을 나타내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다(이진수(2004), 「萬理一空에 관하여」, 한국도교문화학회).
불교에서 말하는 법에는 無常과 常住, 변화와 영원, 소멸과 지속의 양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물성과 관념성의 두 영역이 겹친 구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사물의 무상성, 변화성, 소멸성을 강조하여 표현할 때 우리는 ‘색즉시공(色卽是空)’이라 한다. 색은 법 혹은 사물의 별명이니 법이나 사물이 무상하여 공허하단 뜻이다. 이 같이 공은 법의 사물로서의 무상, 변화, 소멸을 지시한다. 하지만 이것이 법의 자상으로서의 상주, 영원, 지속의 관념까지도 부정한 것은 아니다.
法의 空은 법의 사물로서의 무상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오히려 법의 자상의 상주성을 상징적으로 암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의 공은 일체의 현상을 부정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용어라기보다는 일체의 현상을 긍정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상징이다. 모든 현상은 유로 존재하지만 그 본질은 공이라는 逆接의 관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체의 현상이 유로 존재하는 것은 공의 구조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순접(順接)의 관계를 뜻한다(山折哲雄(2002), 『佛敎とは何か. 東京』, 中央公論新社).
그렇다면 이 같은 의미에서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말한 ‘萬理一空’은 검술의 自性을 말한 것이지, 결코 검술의 허무함을 말한 것이 아님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다꾸앙(澤庵) 선사(禪師)가 쓴 ‘부동지신묘록(不動智神妙錄)’에는 공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이진수(1999), 『일본무도연구』, 서울 교학연구사). 다꾸앙(澤庵)은 이에 대하여 13세기 중국의 승려인 無學이 전란 속에서 元나라 군대에 잡혀 목이 떨어지려 할 순간에 읊은 ‘전광영리(電光影裏)에 봄바람을 베네’라는 偈를 空의 대표적인 예로 들어 설명했다. “적도 空, 나도 공, 치는 太刀도 공, 그러나 그 공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목을 베려고 들어 올린 칼은 번개가 번쩍하고 빛을 발하는 순간과 같으니 거기에는 어떤 마음도 생각도 없다. 치는 칼에 마음이 없고 베는 사람이나 당하는 나에게도 마음이 없다. 베는 사람도 공, 太刀도 공, 당하는 나도 공이니 베는 사람도 사람이 아니고 베는 太刀도 太刀가 아니며 당하는 나도 내가 아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에 허공에 부는 봄바람을 베는 것처럼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이 같은 마음을 가진 승려를 벤다는 것에 가책을 느꼈는지 목을 베려던 원나라 병사는 칼을 버리고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이로부터 5년 후, 살아남은 무학은 호죠(北條時宗)씨의 초청으로 일본에 들어와 일본 불교의 발전에 공헌하였다(이진수(2004), 「萬理一空에 관하여」, 한국도교문화학회).
그래서 다꾸앙(澤庵)은 ‘太刀를 치는 손에 마음을 두지 말고, 손조차 잊어버리고 사람을 베라. 적에게도 마음을 두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찌 칼을 든 사람이 공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인가! 상대를 베려고 눈을 부릅뜨고 서로가 칼을 들고 대치하고 있는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라고 하니 이것은 무엇인가!
이에 다꾸앙(澤庵)은 그러한 가르침 중에서도 ‘사람을 벨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음이 어디에 얽매이지 않아 기술적으로도 무리가 없어 자유롭게 자신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사람을 명인이라 한다. 야규우 무네노리(柳生宗矩)는 장군의 사범이 되었을 정도로 당대의 검술 명인이었지만 그런 그에게 다꾸앙(澤庵)은 마음을 버린 자유의 경지를 이렇게 가르쳤다. 다꾸앙(澤庵)이 강조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는 ‘神道, 歌道, 儒道 등 道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약한다면 이 一心을 밝히는 것’ 이라 주장했다(이진수(1999), 『일본무도연구』, 서울 교학연구사).
일본 무도에 마음을 수양의 주체로 삼은 일은 다꾸앙(澤庵)이나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가 살던 그 때, 일본 불교의 한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禪僧 鈴木正三(1579~1655)이 ‘유심정토(唯心淨土), 기신미타(己身彌陀)’라 하여, 정토가 다른 먼 곳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태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갖고 살아가면 그 때에 자기 자신이 아미타여래가 된다고 주장한 것도 이 시대였다.
청정한 마음 속에 淨土 즉 이상세계가 現前한다는 유심정토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기 직업에 열심히 할 때에 마음이 점차로 정화됨을 전제로 한다. 일본의 불교가 인도 전통의 無我보다는 無私 혹은 無心에 경도된 것에 관해 야마오리는 ‘일본인의 현세 지향적인 자질이 무아라고 하는 지극히 형이상학적인 관념을 수용할 수 없었음’에 있다고 지적했다(山折哲雄(2002), 『佛敎とは何か. 東京』, 中央公論新社).
萬理一空은 수십 년의 검도를 수련하는 가운데에 무사시가 깨친 자기 탐구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대로 禪은 가마쿠라(鎌槍) 무사의 정신수양을 위해 일찍부터 도입되어 있었다.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는 『五輪書』를 쓸 때에도 ‘불법이나 유학의 고어를 빌리지 않고, 옛날의 군기, 군법을 이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체험을 중심으로 하여 『五輪書』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五輪書』에는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의 독창적인 사상이 담겨있다. 공이란 속도 없고 들어가는 문도 처음과 끝이 없다. 이것은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과도 틀려 어디에 구애받음이 없이 자재하며 집착이 없음을 말한다. 무사시가 『五輪書』에서 ‘도리를 얻으면 그 도리를 떠나라’고 한 말과 같으니 이미 얻은 도리에 집착되어서는 안 됨을 뜻한다.
다꾸앙 禪師의 ‘『不動智神妙錄』’에는 ‘마음을 한 곳에 두면 기울어 떨어지게 된다. 기운다는 것은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말하니. 바름이란 어느 곳에도 치우침이 없다.’ 라고 쓰여 있다. ‘마음을 한 군데에 두면 자유롭지 못하다.‘ 라는 뜻은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의 ‘병법의 도는 본래 자유’ 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다꾸앙(澤庵)은 ‘오직 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공부가 바로 수업이다.’ 라고 하여 자유란 마음을 한 곳에 두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을 때 사람은 무한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야모도 무사시(宮本武藏)는 이미 그 도리를 체득하면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병법을 수련하여 자유를 획득한 사람은 그 역량이 저절로 갖추어져 있으며 시기가 도래하면 그 리듬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적을 상대하여 이기게 된다. 이것이 바로 空의 道이다. 공은 자유자재의 경지를 말한 것이다. 이 경지에 이르면 누구라도 초인적인 힘이나 기술을 발휘하게 된다. 다음 편에서 계속 연재한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