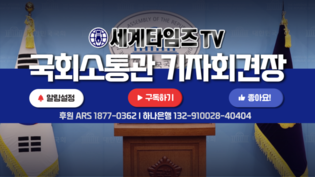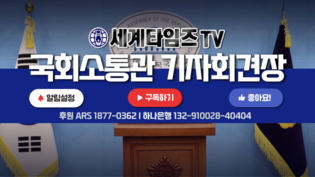|
| ▲송일훈 박사 |
고류유술의 유파 중에 타케우치류(竹内流)의 전서 신체사상체계에는 무명주지(無名住地)가 있다. 제일 먼저 번뇌제불불동지(煩悩諸仏不動知)는 무사가 깨우쳐가는 수행의 지침서이다. 1821년 문정(文政) 4년 사(巳) 죽내구효(竹内久孝) 죽내아문태(竹内雅門太) 작성된 전서이다. 현시대의 무인들에게 필요한 지침서이며 이번 칼럼에서 상세히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무명이란 분명하게 없다고 하는 문자이다. 미혹을 말한다. 주지(住地)는 머무는 위치이다. “머문다”라는 것은 무슨 일이어도 기술을 보는 것은 듣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즉 머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며 병법(兵法)에서 말하면 적이 공격하는 손과 발을 한번 보면, 그대로 거기에 마음이 두는 때는 앞이 빠져 상대에게 제압당한다. 이것을 “머문다”는 것이다. 적이 공격하는 보는 것을 봐도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고 적의 공격에 맞추어도 사안분별도 하지 않고 혼자 박자를 취해야한다. 조금도 마음을 두어선 안 된다.
예를 들면 돌을 치면 곧바로 불이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이 틈도 없게 일이다. 이것을 석화지기(石火之機)라고 하는 데 앞에서 쳐도 좌우에서 쳐도 불과 사지에도 박자에도 살그머니 마음을 두면, 앞에 힘이 빠져 적에게 제압당한다. 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내 몸속에서도 마음을 한 곳에 두면 두는 곳에 마음을 빼앗긴다. 모두에 마음이 두는 것을 주지(住地)가 번뇌(煩悩)에 머무는 것을 싫어하는 이치와 같다.
부동지(不動知) : 부동(不動)이란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자이다. 지(知)란 지혜이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도 돌이나 물과 같이 무성(無性)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정도에 어떤 몸놀림도 해선 안 된다. 마음은 움직이고 싶게 움직이면서 조금도 마음의 행선지에 머물지 않고 마음은 내 몸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 움직이는 것을 부동지(不動知)이다. 이 지(知)를 이름 붙여 부동명왕(不動明王)이라고 한다. 올바른 곳으로 자세를 취하여 왼쪽으로 줄을 가지는 모습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눈을 화나게 하는데 있다. 모습은 불법수호(仏法守護)와 같다. 내면적인 깨달음 부동(不動)의 모습으로서 사람에게 본보기로 하는 것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의 위는 부동지(不動知)라고 한다. 만약 하나의 손에 마음을 두면 9백 99의 신체기법의 재주가 있는 손이 쓸모가 없게 된다. 즉 머물지 않는 것으로 천의 손이 쓸모가 있게 된다. 관음이라고 해도 천의 손은 없지만 부동지(不動知)가 되었다고 하면 손이 천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천수관음(千手観音)이라고 하는 불체(仏体)이다.
부동지(不動知)의 위에 이르렀다면 오히려 원래의 주지(住地) 초심의 위치에 떨어진다. 이것을 병법(兵法) 위에서 말하면 완전히 병법(兵法)도 알지 못하고 몸의 자세, 유술의 자세에도 마음을 두는 것이 없고, 아무 마음도 없다. 그러한 곳에 다양한 습득을 하고 하는 곳에 마음이 두어서 적을 제압하려고 하면 후의 마음이 되어 오히려 사람에게 맞는 것이야 말로는 그 습득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또 세월을 거쳐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악의가 사라지는 곳에도 마음이 두지 않고 수족 몸에 움직임을 느낄 때 최고의 유술경지에 이른다.
이것은 초종(初終)을 닮아 있다. 위치라고 해 하나에서 10에 세고 돌리면 1과 10이 되는 것이다. 무심무념(無心無念)의 위치라고도 한다. 수족 몸의 움직임만으로 마음은 조금도 두지 않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어리석은 범인(凡人)의 최초부터 지혜가 없을 정도에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극한에 이르러 있는 사람은 지혜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에 완전히 지혜가 몸놀림에 나오지 않는다. 만사의 몸놀림은 재치에 구별 없게 이루어지고 처음의 범인(凡人)과 같이 되어 마음을 다 버린다 능숙하면 안 된다. 더 없는 도(道)의 길에서는 지혜를 버리는 것이다.
사리지수행(事理之修行) : 사(事)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손발로 할 기술을 말한다. 처음에 배울 때 자세를 취해 검을 가지는 방법 혹은 사용법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理)의 수행이란 일심(一心) 위의 더없는 곳을 잘 알기 위한 수행이다. 사(事 : 일)의 집행을 위해서 만의 몸놀림에 이르지 않는다. 또 이(理)의 수행을 위해서 사(事 : 일)의 수행이 없으면 손발은 자유롭게 안 된다. 그렇다면 사리(事理)의 두 개는 차의 양쪽 바퀴와 같다. 일심(一心)을 위해서 손발에 연습을 하는 것이다. 수상에 치는 호리병박 찰착(擦着)하면 바로 돌린다. 호리병박이란 표주박이다. 찰착(擦着)함은 손으로 누르는 것이다. 표주박을 물에 던져 누르면 옆에 물러난다. 몇 번 해도 한 곳에 두지 않는다. 극한에 이른 사람의 마음은 수상에서 표주박을 누르는 것 같은 것이다.
응무소주이생기심(応無所住而生其心) : 이 문장을 읽어 보면, 당연 살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읽는다. 수천가지의 기술을 하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손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생기면, 그 몸놀림에 마음이 둔다. 그러므로 두는 곳을 없애고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마음이 생기면 생긴 곳에 둔다. 생기지 않으면 손도 가지 않고 손이 가면 거기에 두는 것이다. 마음이 생겨 그 일을 하면서 다른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그 도(道) 길의 명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두는 마음부터 집착의 생각도 일어나고 윤회(輪廻)도 여기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머무는 마음은 “그 도(道)의 길에 나쁘다”고 하여 방법과 같이 마음을 두는 것은 그 길(道)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다. 생과 죽음의 끊기 어려운 관계라고도 말한다. 예를 들면, 화홍엽(花紅葉)을 봐도 화홍엽(花紅葉)이라고 보는 마음은 일어나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자엔(慈円)의 시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보인다.
사립문을 향기로운 꽃은 있다면 있다. 마음은 꽃은 마음이 없어서 향기가 나고 있지만, 나는 마음을 꽃에 두어 바라보면, 내 몸을 되돌아보고 색에 물들어 가는 마음이 아직도 다하지 않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봐도 마음을 두지 않으면 죄는 없다. 보고 듣고 일을 해도 마음을 한 곳에 두지 않는 것을 최상으로 하는 것이다. 경(敬)의 글자를 주일무적(主一無適 : 마음을 하나의 것에 집중시켜 딴 데로 돌리지 않는 것)라고 주석을 달았다.
그 마음을 한 곳에 잡아 정해 조금도 놓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는데 그 일 하나를 대우해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 후로부터 사지가 무참(撫斬)을 해도 그 쪽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을 경(敬)이다. 일심불란(一心不乱)에서 말해진다. 이러한 경(敬)의 글자는 곧 마음이다.
방심을 추구한다는 것은 맹자(孟子)가 말해진 조사이다. 놓은 마음을 찾아 추구해 내 몸에 돌려주라고 말하는 마음이다. 마음은 사람에 관한 몸의 주체이고, 나쁜 길에 가 머무는 것을 어디든지 찾아 추구해 나에게 나를 돌려주지 않는다. 소강절(邵康節)이라는 것은 마음을 놓아 이 마음을 잡고 채워선 안 된다. 묘지묘술로 고양이를 연결하듯이 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물건에 마음이 물들지 않게 잘 쓰고 마음을 다 버려 일체가 되어 나중에 놓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초심은 무사가 신체로 기법을 유형 할 때 몸놀림에 마음이 두어 적에게 마음을 빼앗기므로 비유하는 말이다. 이르러서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면 진흙에 있어도 맑고, 닦은 수정의 구슬은 진흙에 들어가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이루어 가고 싶은 곳이다. 그리하여 마음을 긴장시켜 좋은 것은 초심 때의 일로이다. 즉 주일무적(主一無適)과 일심불란(一心不乱)은 같은 용어이다. 병법(兵法)으로 말하면 타수(打手)에 마음을 두어선 안 된다. 완전히 타수(打手)를 잊어버리라는 말이다. 마음이 부족하지 않게 사람도 공(空)의 타수(打手)도 공(空)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본심(本心) 망심(妄心) : 본심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전체에 널리 퍼지는 것이다. 뭔가 마음에 깊이 생각해 한 곳에 모여 굳어지고 망심(妄心)이 된다. 본심이 사라졌으므로, 곳곳에 숨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심은 물과 같다. 망심(妄心)은 얼음과 같다. 얼음과 물과는 하나여도 얼음에서는 얼굴도 손도 씻을 수 없다. 얼음을 녹여 물로 하면 어디에서라도 자유롭다. 물과 같은 마음을 전신에 늘려 넓혀 쓰는 곳에 주고 쓰는 것이다. 이것을 본심(本心)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사는 고류 유술을 수행할 때 흐르는 물과 수신법으로서 본심을 가지고 임해야 최고의 경지인 극치와 이치에 도달 할 수 있다.
유심(有心) 무심(無心) : 유심(有心)은 망심(妄心)으로 같은 것이며 무슨 일에 대해도 한쪽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을 유심(有心)이라고 한다. 무심(無心)이란 본심(本心)이다. 한 곳에 굳어져 정할 것은 없다. 분별사안(分別思案)을 해도 별 일 없을 때는 마음은 전신에 늘어나고 퍼져 전체에 널리 퍼지는 마음을 무심(無心)이라고 한다. 무심(無心)이라고 해도 석목(石木)과 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두는 것이 없는 것을 무심무념(無心無念)이라고 한다. 항상 쓰는 것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살펴보듯이 차는 축이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것이다.
마음도 뭐라고 하는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음에 물건이 있기 때문이다. 또 마음에 있는 것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빨리 굳어져 있는 만큼 떠난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떠나 스스로 무심(無心)이 되는 것이다. 항상 유의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고가(古歌)에 말하려면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생각해 버린다. 즉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마음의 놓아 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움직임에 마음을 두면 적의 움직임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적에 마음을 두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또 나의 자세에 마음을 두면 또 그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적을 제압하려고 생각하는 곳에 마음을 두면 그 곳에 마음을 빼앗긴다. 다만 나의 마음을 배꼽 아래에 눌러 그밖에 주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적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화(転化)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상 마음은 내 몸 가득 미쳐 전신에 늘어나고 넓혀 얼마인가 손에 들어 올 때는 신체기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들어가는 몸놀림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사안분별(思案分別)하면 그 마음을 빼앗길수록 아무것도 미치지 않고 전신에 놓아두는 것이다. 한 곳에 두면 하나에 떨어진다고 해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다. 정심(正心)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으로 마음을 늘려 한쪽에 가까워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어디에 둔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전체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을 한 곳에 두지 않는 궁리이며 이것이 수행의 제일이다. 고병도기(古兵道記) 이 서적의 내말지(内末紙)에 모든 마음을 두는 곳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연재한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