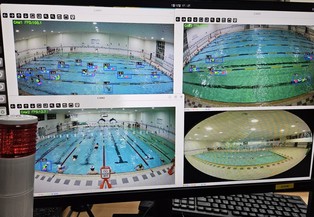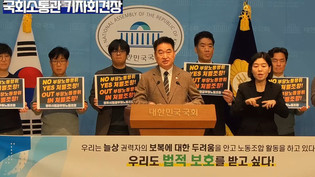|
| ▲ 김병일 |
미투 운동에 이어 최근에는 갑질 미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대기업 회장 아내라는 사람의 폭언, 폭력이라고 하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피해자 회유하는 내용까지 밝혀지고 있어 대부분 "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들은 공공의 적이 될 정도다. 여기에 더해 그 자녀들이 저지른 폭언, 불법성의 문제도 수사대상이 되고 있으니 한 집안이 자기 하나 다스리지 못한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어서 보통사람이라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다.
주변에서 흔히 하는 말이 " 저 사람들은 부끄럽지도 않나봐?" 하는 얘길 한다. 부끄러움에 대한 자기 성찰과 지각을 상실한 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가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도 태연한 인간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일까. 오강섭(강북삼성병원. 정신과)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유전자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인지 기능이 싹트는 만 2세를 넘어야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하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이 감정을 제대로 느끼게 된다고 한다. 부끄러움에 대한 심리가 개인마다 다른 까닭은 성장환경과 고유한 경험에 따라 이 감정이 강화되거나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부끄러움을 탄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행위이므로 그 후에 표현되는 대처방식은 각 개인의 성격과 사회환경, 규범, 분위기, 상황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인해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부끄러움을 감추고 수치스러움을 억지로 덮으려 애를 쓸수록 그것을 바라보는 상대는 매우불쾌하다. 잘못을 인정치 않고 변명만 앞새우는 듯 느껴지기 때문이다. 류인석(前 경향신문 중부본부장, 現 본클럽 회원)은 '부끄러움'이란 자아의 정립과 통제를 추구하기 위한 '자기 처벌'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 처벌은 "자아의 성찰과 냉혹한 반성"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한다.
중국 관자(管子)는 "예의와 염치는 나라를 유지하는 수칙"이라 강조하고 "이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경고했다. 그 기업(집안)이 경제적 지위를 형성하는데 오랜 세월을 견뎌 냈겠지만 예의와 염치의 수칙이 무너진 가정과 기업이 대대손손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치열해져가는 경쟁체제 속에서 독일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수치를 드러내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국가의 위상은 회복됐고 국민들은 그 부끄러움을 잊지 않기 위한 사회체제 안에서 수준 높은 의식을 갖게 됐다. 반면, 부끄러움 없이 종전 후 아직까지도 전범국으로서의 자기반성 한 번 없는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다.
패전 후 한반도 전쟁을 통해 다시 빠른 속도로 경제적 회복을 이뤘고 지금은 부국으로서 세계에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수치를 감추기 위한 행태로 후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의 역사를 또 써내려가고 있다. 역사는 분명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평가 되어질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사람은 개인으로서 가정안에서 사회안에서 역사를 써가고 있다. 기업도 나라도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가 가고 있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뻔뻔함의 행위가 오히려 수치스러움의 역사로 자신에게 기록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인정하고 드러낼 줄 아는 진정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